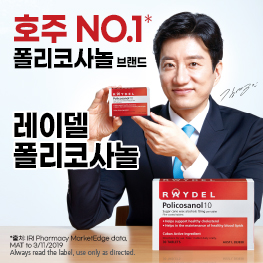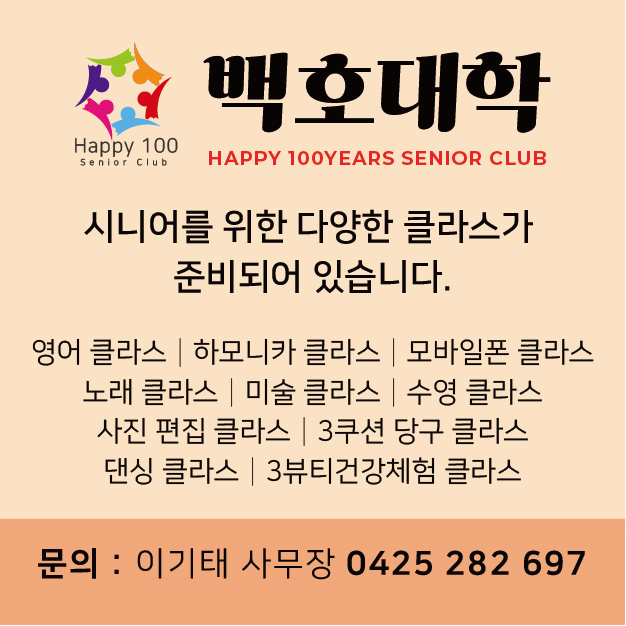202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집계되며 9년 만에 상승했다. 이는 전년 대비 0.03명 증가한 수치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반등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도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늘어났다. 인구 감소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번 출산율 반등은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받고 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와 ‘2024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23만 명)보다 3.6%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증가세를 보인 것은 9년 만의 일이며, 2023년 역대 최저치 이후 처음으로 반등한 것이다.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도 4.7명으로 전년보다 0.2명 상승했다.
2016년까지만 해도 40만 명을 웃돌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 7,800명으로 40만 명 아래로 내려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왔다. 특히, 2020년(27만 2,300명)과 2022년(24만 9,200명)에는 각각 30만 명, 25만 명 선이 무너졌다. 2023년 4분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분기별 합계출산율이 0.6명대(0.65명)까지 하락하며 우려가 커졌으나, 이번 반등으로 0.7명대를 유지하게 됐다.
결혼 증가와 인구 구조 변화가 출산율 상승에 기여
출산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는 혼인 건수 증가와 인구 구조 변화가 꼽힌다. 2024년 혼인 건수는 222,422건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하며 197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기되었던 결혼이 다시 활발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1991~1995년 사이 태어난 인구가 출산 적령기에 접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 태어난 인구는 연간 70만 명을 넘었으며, 이들이 30대에 진입하면서 출생아 수 증가에 기여했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출산율 상승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월 육아 수당을 3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를 적극 지원하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맞벌이 가정을 돕기 위한 정책도 추진 중이다.
기업들의 출산 장려 노력
일부 기업들도 출산 장려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건설사인 부영그룹은 직원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7,500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러한 기업 차원의 지원이 직장인들의 출산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출산율 증가를 위한 과제
전문가들은 이번 출산율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인 증가를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높은 경제적 부담, 주거 문제, 육아 지원 부족 등은 여전히 출산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다.

미래 전망과 대응 전략
정부는 2031년까지를 인구 감소 해결의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출산율 상승을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출산율 반등은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이를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사회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 향후 정책과 대응이 한국의 인구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가 주목한 한국의 출산율 변화
한국의 출산율 변화는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극도로 낮은 출산율 문제로 인해 해외 주요 언론들도 이를 집중 조명했다. 호주의 ABC와 9뉴스, 영국의 가디언(The Guardian), 중동의 알자지라(Al Jazeera) 등 주요 매체들은 한국의 출산율 반등 소식을 전하며, 저출산 문제와 정부의 대응을 분석했다. 이는 한국의 출산율 변화가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경미 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