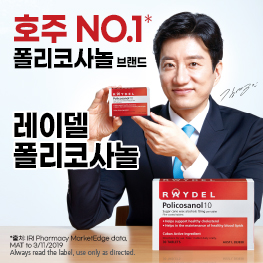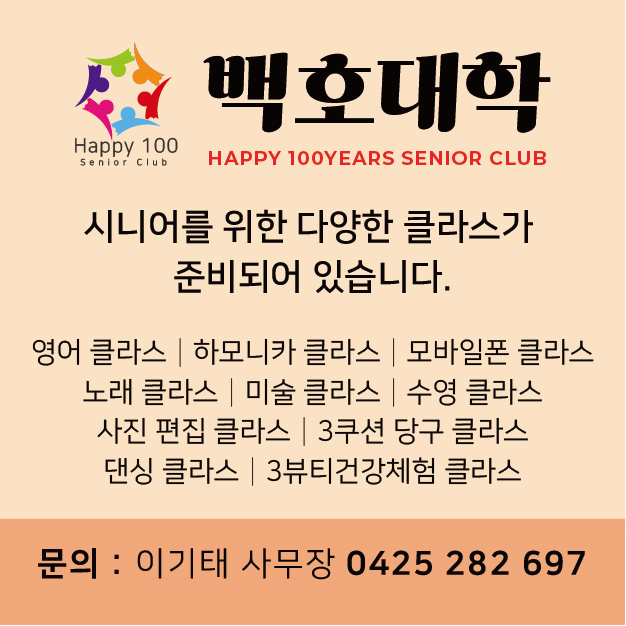아시아 최초 전미번역상 수상 작가 … “세계 문학의 흐름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데뷔 20년차 시인이자 김춘수시문학상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있는 김이듬 시인.
그를 시단의 중심으로 끌어당긴 시집 ‘히스테리아’의 영미 번역본이 한국문학 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전미번역상과 루시엔스트릭 번역상을 동시 수상하면서 한국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성차별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시쓰기는 도전이며 좋은 시는 질문을 던지는 시이다. 모든 시는 나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2021년 여성신문과의 인터뷰가 아니라도 그에게 시는 함께 구르고 품고 씹고 때로는 도망갔다가도 여지없이 그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랑병’과 같다.
시드니에서 열린 동주해외문학상 시상식에 그 김이듬 시인이 왔다. 계간 웹진 시산맥 주간이기도 한 그는 시상식을 마치고 특강을 진행했다. 화려한 마스크에 솔직한 입담을 갖춘 시원스러운 강의였다. 김 시인은 해외에서 한국시가 가진 위상, 국제시 축제 현장, 그리고 현재 해외에서 주목받는 시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국제시 축제와 한국시의 위상’이라는 주제로 김 시인은 “세계 문학계에서 한국이 주목받고 있는데 문학의 기운이 시드니로 옮겨온 것 같다’며 참석한 문인들에게 살포시 기대감을 주면서 강의를 시작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격려의 말은 아니겠지만 시를 쓰며 자주 좌절하는 나 역시 속없는 미소가 흘러나왔다.
진주와 강원도 산청에서 담배 피는 할머니의 욕을 들으며 어린 시절을 보낸 김이듬은 이민자와 유배자의 마음으로 시를 썼다면서 외로웠던 자기 곁에 언제나 함께 한 시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녀는 “실력보다 중요한 지연과 학연, 가르쳐줄 스승도 없이 간절히 문학을 사랑하며 바닥에서부터 시작했다. 아무런 눈치 보지 않고 시를 쓰리라 하는 마음으로 시에 기대어 살아가는 가운데 해외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도약하며 국내에서도 유명해진 기적과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났는데 시를 쓰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런 면에서 인생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며 시가 가져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새엄마를 둔 아버지와 오랫동안 불화를 겪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품으며 시를 써 온 길은 고독하고 서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시가 나의 친구이고 나의 연인이고 나의 길이다”.
생전에 그의 아버지는 이왕 시를 쓰려면 윤동주처럼, 김소월처럼 쓰라고 하셨다. 평생 가까워질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아버지였다. 자신이 전미번역상을 수상한 계기로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었기에 그녀에게 시는 화해의 문학이기도 하다. 김 시인은 중심에서 멀어진 사람, 뼈아픈 고통을 겪고 눈물 어린 밥을 먹어본 사람이라야 비로소 시의 진정성에 닿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슬로베니아라는 작은 나라에서 열리는 국제시 축제 방문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 작은 나라에서 열리는 국제시 축제의 테마가 ‘한국의 시’였는데 외국인들에게는 고유한 운율이 담긴 한국어 시가 번역되면서 시 이상의 울림을 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국 현대시의 역사가 100여년이 넘어가는데 한국어로 쓴 시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최절정에 와 있는 느낌이다. 이렇듯 세계적인 흐름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는 만큼 꾸준히 작품 활동하다 보면 머지않아 여러분의 작품도 세계적 시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국시의 세계적인 관심에 대한 그의 확인은 “당신이 한국어로 쓴 시는 한국어를 모르는 누군가의 가슴에 닿을 때 위로와 기쁨의 현을 연주하는 아름다운 음악일 수 있다”는 메시지였다.
시드니 로잉 클럽에서 뒷풀이를 마치고 페리를 타고 떠날 때 김이듬 시인의 가슴에는 어느 동포 시인이 준 시집이 꼭 안겨 있었다.
“나는 내가 죽고 나면 내 시를 읽고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하며 내 죽음 이후의 시를 생각하기도 했다. 이생에서 시와 소설, 수필을 짓는 작업으로 시드니에서 살아있음을 증명하시기를 바란다”.
글로 “증명하라”는 김이듬 시인의 말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바래지 않는 빛으로 기억의 창고에 남을 것이다.
전소현 객원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