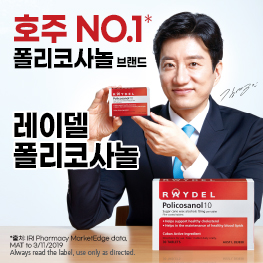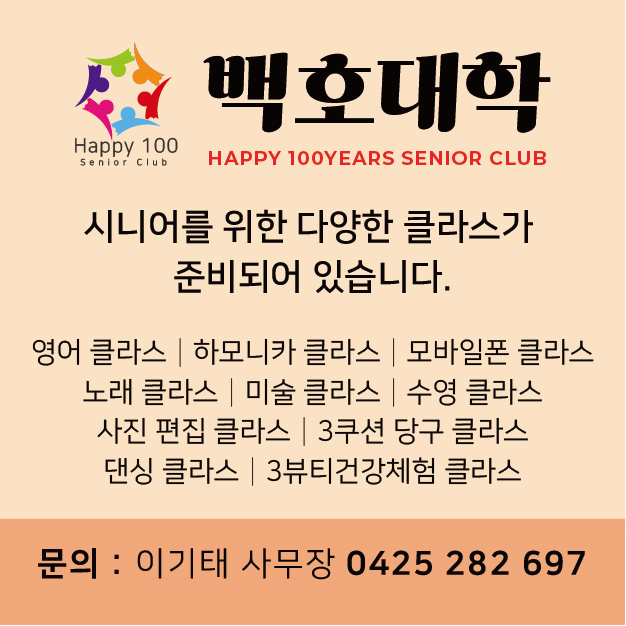앵무새 죽이기
생각해보라. 인간의 삶은 생로병사, 희로애락의 연속이 아닌가. 인간이 타고난 저마다의 기본적인 조건과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한, 기쁠 때 슬플 때, 화날 때도 미칠 때도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모두가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행복할 때와 불행할 때는 차원이 다르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고 톨스토이(Leo Tolstoy)는 소설 <안나 카레니나>(Anna Karenina)에서 말했다. 하지만 도리어 지금 같은 시대엔 “불행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행복한 가정은 그 이유가 제각각”이라는 나보코프(Vladimir Nabokov)의 패러디가 더 와 닿을 때도 있다.
“행복합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각 없이 바로 “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불행한 것들은 쉽게 말할 수 있는데 행복한 것은 생각해 봐야 한다?
하퍼 리(Harper Lee)가 쓴, 인종차별을 다룬 소설 <앵무새 죽이기>(To kill a mockingbird)는 1960년 출간되었다. 그다음해인 1961년에는 퓰리처상(Pulitzer Prize)을 받았으며, 62년에는 그레고리 펙(Gregory Peck) 주연으로 영화화됐다. 20세기 성경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으로 불리면서 그 이후로도 연극과 영화로 상영되었다. 많은 사람이 제목은 많이 들어봤지만 ‘앵무새 죽이기’가 무슨 내용일지 잘 모를 것이다. 최근 한국 드라마를 미국에서 리메이크한 ‘굿닥터’(Good Doctor)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앵무새 죽이기를 접했다. 에피소드의 제목으로 ‘앵무새 죽이기’가 나오길래 내심 어떤 내용일까 기대를 했었는데, 원작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인공 역의 의사 동생이 죽기 전 읽다 만 ‘책’을, 죽은 동생과 닮은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다였다. 하지만 그 책을 왜 줬을까 의문이 든다.
원작 <앵무새 죽이기>의 주인공은 바로 스카웃이라는 이름의 7살 여자 어린아이다. 스카웃과 잼은 메이콤이라는 마을에 사는 남매다. 남매는 나이보다 훨씬 작은 소년 딜과 친하게 지낸다. 아이들은 항상 집에서 나오지 않는 수상한 ‘부’의 집을 염탐하는 것이 놀이가 되었다. 아이들에게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변호사 애티커스라는 아버지가 있다. 국선 변호사로 가난한 사람들의 변호를 하면서 청빈한 삶을 살던 중에, 백인 소녀 이웰을 강간한 혐의로 체포된 흑인 청년 ‘톰’의 변호를 맡게 된다. 백인 중심의 마을에서 흑인을 변호하는 일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애티커스는 변호사의 권리를 충실히 이행한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공공연히 협박한다. 백인 이웰이 톰을 유혹하는 장면을 목격한 이웰의 아버지 ‘밥’의 분노로 톰이 모함에 빠졌다는 결정적인 단서로, 톰이 범인이 아님을 주장하지만 백인들로 이루어진 배심원들은 진실보다는 흑인이라는 사실에 만장일치로 유죄임을 주장한다. 작품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아이들의 눈으로 서사하고 보여준다.
애티커스는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끝까지 자식들에게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를 행동으로 보여준다. 바로 ‘배려’와 ‘포용’으로 말이다.
배려와 포용이 없었던 사회는 결국 애꿎은 두 마리의 앵무새였던 ‘톰’과 ‘부’를 희생시킨다.
아빠 애티커스가 공기총을 가지고 노는 젬에게 말한다. “난 네가 뒤뜰에 나가 깡통이나 쏘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새들도 쏘게 될 거야. 하지만 앵무새를 죽이는 건 죄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앵무새는 인간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복을 전달해 주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소설과 영화에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공존을 이야기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말한다. 사람답게 사는 건,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며 사람이 사람을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면서 사는 것을 뜻한다.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죽이는 게 아니고.
하지만 아직도 이 사회는 앵무새 죽이기가 끊이지 않는다. 인종차별, 지역주의, 계층 간의 골, 폭력, 증오 그리고 집단행동과 같은 뉴스를 쉽게 접하니 말이다.
영화에서 진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들을 멸시하는 주류 쪽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회 현상이다. 사실 우리들 인간은 한 명 한 명의 얼굴들이 다르듯이 모두 다르고, 그런 다른 점이 인간을 정의한다고 보는 데, 억지로 같은 ‘사람 군’을 형성시키고 자신들만의 규칙을 만들어, 그곳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차별한다. 그래서 과연 행복해 질까 묻고 싶다. 불행한 가정의 불행한 이유보다 행복한 가정의 행복한 이유를 더 듣고 싶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지길 원한다.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나도 행복해지는 길을 찾는 것도 좋으리라.
가끔 지루한 삶이 무한히 반복되거나, 허투루 지나치는 삶이 있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소설이나 영화를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삶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속삭여주는 고전의 목소리에 잠깐이나마 귀 기울이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본다. 그래서 잠시나마 행복한 이유를 생각해본다.
강해연 / 이유 프로덕션 & 이유 극단(EU Production & EU Theatre) 연출 감독으로 그동안 ‘3S’, ‘아줌마 시대’, ‘구운몽’, ‘구운몽 2’ 등의 연극과 ‘리허설 10 분 전’, ‘추억을 찍다’ 등의 뮤지컬, ‘Sydney Korean Festival’, ‘K-Pop Love Concert’ 외 다수의 공연을 기획, 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