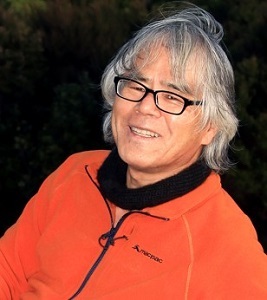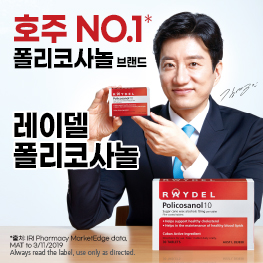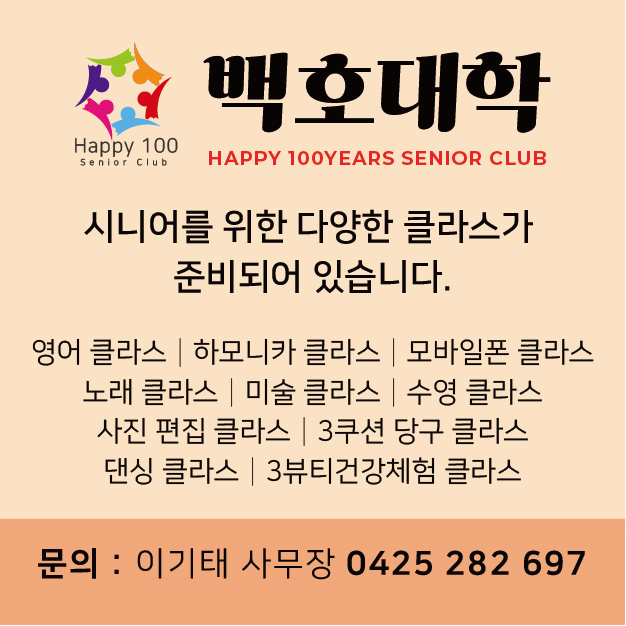찬송가와 유행가 사이에서
나는 아버지가 유행가를 부르는 것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다. 팔십 평생 사시면서 삶이 버겁고 지칠 때마다 스트레스 풀이 삼아 가끔은 불렀을 뻔한데도 콧노래로 흥얼거린 것조차 기억이 없다. 그렇다고 음치였거나 노래 부르는 그 자체를 싫어했다고 할 수는 없다. 누구보다 노래를 ‘씩씩하게’ 잘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인생 말년에 가끔 보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아버지 연세뻘인 송해가 진행하는 ‘전국노래자랑’이었다. 그렇다고 귀를 세우고 주목하는 편은 아니었다. 봐도 좋고 안 봐도 좋은 일종의 ‘시간 보내기용’이었다. 그 프로를 볼 때마다 아버지는 애써 침묵했다. 세상 것에 대한 호불호를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였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성직자의 길을 걸었다. 내 기억에 아버지의 숨겨진 사생활(?)은 없었다. 늘 성(聖)스러웠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쓴 것은 자식으로도 인정한다.
나는 아버지가 설교를 잘한 명설교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설교 중간 중간 찬송을 부를 때는 성악가 못지않은 기량을 뽐냈다. 청중들은 설교에서 받은 은혜보다 찬송에서 받은 은혜가 더 컸을 거로 생각한다.
내 컴퓨터 한 공간에는 아버지의 설교가 들어 있다. 오클랜드 어느 교회에서 한 설교 녹음이다. 돌아가시기 한 해 전이었다. 아버지는 항암(간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강단에 올랐다. 한 시간에 가까운 그 설교에서 아버지는 성도들을 향해 애타게 호소했다.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의 진리를 깨우쳐 주고 싶어한 열정이 느껴졌다.
아버지의 고별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눈시울이 붉어진다. 목이 아닌 가슴에서 터져 나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사이 씩씩한 찬송을 듣다 보면 마치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생생하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아버지가 마지막에 즐겨 부르던 찬송이었다.
나는 어머니가 유행가를 부르는 것을 숱하게 보았다. 여든 넘게 사시면서 삶이 고단할 때마다 어머니는 달곰한 유행가를 불렀다. 그중 어머니가 자주 부른 노래는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어머니는 그 노래를 삼절까지 다 하곤 했다.
“아마 삼절까지 가사를 다 외우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걸.”
어머니가 평소 내게 자주 한 말씀이었다.
어머니는 아홉 살 때 엄마(내게는 할머니가 된다)를 병으로 잃었다. 그 한이 평생 이어졌는지 시도 때도 없이 ‘어머니의 마음’을 불렀다. 교회 어버이날 행사 때에도, 설날 어르신 잔치 때에도 18번이었다.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어떻게 여든 넘은 할머니가 그렇게 노래를 잘해요. 박자도 하나도 안 틀리고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몇 달 전 ‘10분 콘서트’를 열었다. 호주에서 건너온 두 딸, 오클랜드에 사는 큰딸과 아들 그리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 부부가 청중이었다. 공원 벤치에서 어머니는 신나게 세상 노래를 뿜어댔다.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라도 시원하게 털어내고 싶으셨던 것 같다.
내 모발폰 한 공간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노래 공연 실황이 들어 있다. 지금도 가끔가다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듣곤 한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 이 공연을 보면 웃음이 터져 나온다. ‘나 죽어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이 노래 들으며 웃고 살아라’는 뜻이었던 것 같다.
“고향 떠난 65년~~ 버드나무 꺾어 불던….”
어릴 때 꿈이 ‘카수’였던 어머니가 이 지상에서 부른 마지막 세상 노래였다.
둘째 누이가 카톡을 통해 동영상을 한 편 보내왔다. 어느 교회 초청을 받아 부른 특송이었다. 찬송 제목은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둘째 누이는 우리 집에서 제일 노래를 잘한다. 성악 공부를 시키지 못한 게 아버지의 큰 아쉬움이었다. 몇 해 전 찬양 시디를 한 장 낼 정도로 아마추어로는 정상급이라고 봐도 된다.
피아노를 전공한 여동생도 둘째 누이의 90%는 한다. 영어로 된 찬양 시디를 두 장이나 냈다. 그의 노래 동영상 유튜브 조회 수가 2만에 가깝다. 그 가운데 5%는 내 귀에 들어 있다. 세 살 위 형도 발라드풍 노래를 좋아하고(기타 실력도 수준급이다), 오클랜드에서 사는 큰누이도 뽕작형 트로트를 맛깔나게 잘 부른다. 나 역시 바이브레이션이 심한 노래를 나름 힘차게 뽑을 수 있다. ‘목사’ 박 씨와 ‘카수’ 한 씨 사이에 태어난 다섯 자식은 노래에서만큼은 ‘한 자랑’하는 셈이다.
요즘 내 즐거움은 둘째 누이가 부른 ‘내가 처음…’을 흥얼거리는 것이다. 하루에 두세 차례 그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른다. 그러면서 지금은 내 곁에 없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노래 가운데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며 살아야 할까, 고민하면서 말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내 장례식에 세 곡의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첫째는 배철수가 부른 ‘사랑하는 이여 내 죽으면’이고, 둘째는 조수미가 부른 ‘기차는 8시에 떠나네’다. 첫 노래는 죽음의 슬픔이 묻어 있고, 둘째 노래는 멋진 바닷가에서 듣던 추억을 가장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노래는 헨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다. 그 어느 날 내 생이 다 끝났을 때 나를 맞으실 하나님과 육신의 부모를 그렇게 기쁨으로 맞고 싶다.
그런데, 찬송가와 유행가 사이에서 늘 헤매고 있는 나는 어떤 노래를 좋아해야 한다고 할지 잘 모르겠다. 억지로 새 말을 만들어냈다.
‘찬행가.’
언제 박성기가 부르는 찬행가, 한 번 들어 보실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