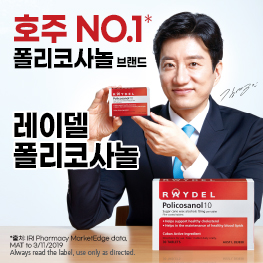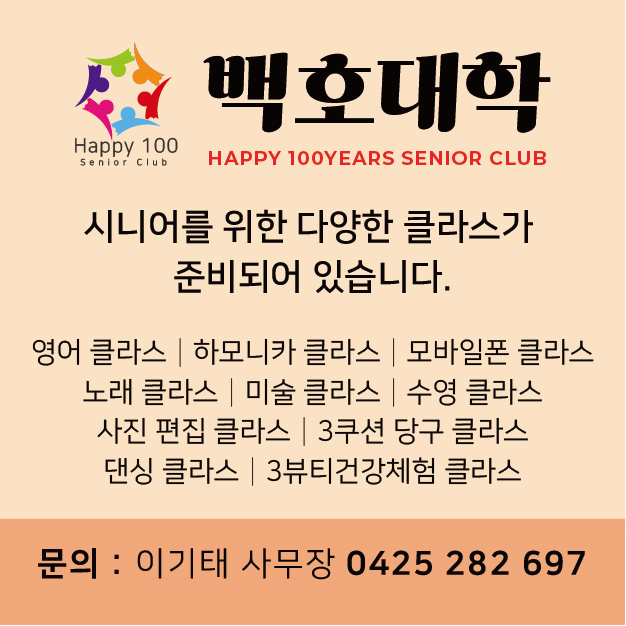재외동포청장의 시드니 방문
해외 한인사회의 ‘오랜 숙원’이라며 큰 기대를 모아 오던 재외동포청(이하 동포청, 고국에서 작년 6월 설립)의 이기철 청장과 참모들이 해외 현지 탑사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2-13일 시드니를 방문했었다. 이에 앞서 이 방문 계획을 서울의 <세계한인신문> 보도를 보고 안 필자는 경고성 글을 그 신문과 여기 <한호일보>에 썼었다.
방문 목적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시드니 한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었다니 여기 우리 대표들은 어떤 말을 들려주고 어떤 건의가 있었는 지 궁금하다. 교포신문 보도에는 청장과 수행한 국장이 한 발언 말고는 우리 쪽이 거론한 내용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말한 경고성 글에서는 그간 필자 자신이 참석해봐 잘 아는대로 대개 100여명이 모여 의전 위주 행사가 되기 쉬운 이런 간담회에서 고국이나 한인사회의 복잡다단환 문제를 놓고 말로 문답하거나 건의를 해 봤자 제대로 파악될 수 없으니 재외동포정책 실무자들은 나와서 보고 듣기 보다 평소 현안을 총괄적으로 정리한 건의서를 받아 정책에 방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이청장과 시드니 간담회는 조금 지났다. 하지만 한인사회의 발전과 위상제고를 앞세우는 단체장들은 이런 이슈들을 어느 시점이 아니라 두고두고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구성원 간 대중 메시지 전달이 어려운 게 현 한인사회의 실정이다. 아래 재외동포청장이 현지에서 발표한 새 정책에 대한 필자의 의견이 더 많은 독자들에 전해 질 수 있기를 바란다.
재외동포 업무의 통합
한국의 발전상을 호주의 교과서에 많이 반영되게 하겠다는 이청장의 발표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이다. 동포청의 설립 이유 하나는 그간 여러 기구에 분산된 고국의 대(對)동포 업무를 한 곳에 통합하는 거라고 들었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발전상을 해외 사회에 알리는 이 업무는 기왕의 외무부 산하 국제교류재단(The Korea Foundation)이나 해외 주요 도시에 한국문화원을 두고 있는 문화체육관광광부와는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가.
고국은 해외 교포언론사를 광고로 지원하고 매년 세계한인언론인대회란 이름으로 기자들을 서울로 불러들인다. 주체는 언론진흥재단이나 예산은 나라 돈인데 앞으로 그대로일까.
교포 거주국 나라의 교과서에 고국의 발전상이 많이 실리게 된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런 프로젝트는 조용히는 몰라도 공개적으로 발표해도 되는 가이다. 얼마전까지 중국이 공자학원(The Confucius Institute)이란 연구소를 서방의 대학들에 설립, 재정 지원을 했다가 해당 국가들의 비난을 받아 지금은 모두 퇴출된 것으로 안다. 한호 간 관계는 우호적이어서 정부 레벨에서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언론은 다르다. 2000년 초인가 시드니에 한국문화원이 개원할 때 호주 유력지가 대한민국이 커져 호주에 Soft Power(지적 또는 두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고 약간은 비아냥조로 썼었다.
각자도생
이청장은 동포청의 업무의 원칙으로서 교포들의 정체성 함양과 현지에서의 지위 향상을 들었다. 이건 원래부터 고국의 재외도포정책의 2대 근간이다. 그건 일견 상호 이율배반이어서 쉽지 않으나 정책방향으로는 타당하다. 그런데 실제를 보면 유럽 등 서방국가 출신들에 비하여 한인들은 정체성이 너무 강한 게 탈인데 지위향상이나 주류사회로의 통합은 반대다.
고국이 여기 교과서에 아무리 잘 반영되어도 현지 교민들이 잘 못하거니 함을 합치지 못하고 각자도생(各自圖生)으로 살아간다면 현지에서의 위상이 높아질 수가 없다. 공부 잘한 2, 3세 한인들이 의사, 변호사, 기업의 간부 등 고급 직장에 취직을 하는 수가 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전체 한인 인구에 비하면 소수다. 또 아직도 이민이 유입되어 1세, 1.5세가 이끄는 한인사회 전체가 그 사람들 소수의 덕으로 그냥 위상이 좋아지고 한인 다수가 겪는 애로가 덜해진다고 말할 수 없다.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호주의 경우, 시민권자인 그들이 우리는 고국이나 코리안 커뮤니티를 위하여 뭘 따로 하겠다고 나설 수도 없는 일이다.
주류 매체로의 접근성 부재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걸 여기에서 다룰 수 없다. 하나만 의제로 내놓겠다. 호주에서 전체로서 한인들이 겪는 애로 극복이나 지위향상은 거주국 정부와 주류사회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에 대한 주된 통로는 주류 매체이다. 호주 정치인과 개인적으로 절친하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간 영미지역 한인사회의 사례를 보면 주류매체로부터 부당한 대접을 받아도 속수무책이고 누구 말마따나 우리끼리만 지지고 볶고 하다가 끝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 대한 평소 대비가 없고 언어차별(Linguistic disparity, 이건 인종차별이 아니다) 때문이다. 한국에서 자라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도 큰 신문이 실어 줄만한 민생 관련 칼럼이나 기고문을 당연히 쓰지 못하는 것처럼 영미사회에서 자란 한인들도 마찬가지다. 따로 훈련이 필요하다.
필자가 아는 한, 미국의 <뉴욕 타임스>, 영국의 <더 타임스>, 호주의 <시드니모닝 헤럴드>, 캐나다의 <글로브 앤드 메일> 수준의 국제매체에 실릴 칼럼을 쓰는 한인 인재가 거의 없다. 과거 재외동포재단이나 관련 기구들은 한국문학과 정체성 장려책으로 작품 현상 공모를 꾸준히 해왔다. 왜 해외 한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한인 영어 칼럼니스트나 기고가 장려책은 전무한가.
김삼오 / 언론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