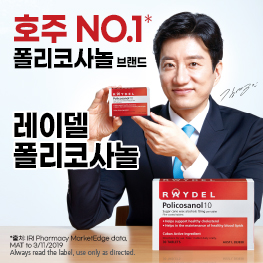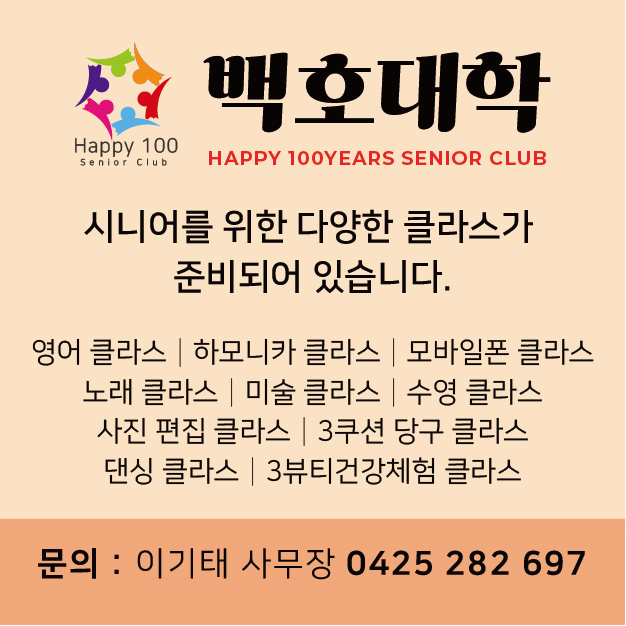문화예술계의 대안 ‘소극장 운동’, 그 힘든 일을 해내려 합니다(2)
여러 공연이나 행사들의 일을 맡아서 많이 했다. 준비하는 과정과 행사를 끝내고 난 뒤의 결과는 항시 비슷비슷하다.
결론은 ‘나와 너’의 행사 그리고 그 밖에 있는 ‘그들’은 깔보기나 헐뜯기 대상이 된다. ‘나와 너’가 하는 문화적 움직임들은 ‘나와 너’가 아닌 ‘그들’에게는 움직임이 아니다. 문화도 아니고 예술도 아니다. 그저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쉽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뒷담화를 듣는다.
“예술은 무슨…”
“그런 행사를 왜 해?”
“그 시간에 돈이나 벌지”
문화는 공간이라는 장소를 통해 발현함으로써 그 존재가 객관화되는 것이므로, 발현공간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앞에 대극장 소극장에 대해 정의했듯이, 대극장이 상업극을 위주로 공연을 해온 데 비해 소극장은 새로운 실험을 위한 창작 공간으로의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대극장은 장기간의 공연과 티켓 판매에 목적을 둔 상업화된 공연방식이라 할 수 있다. 반대의 의미인 소극장은 자유로운 창작과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무대구조와 관련된 공연방식으로, 대극장은 무대와 객석의 거리감으로 인해 완전한 극적 효과를 얻을 수 없다. 반면 소극장은 배우들의 대사와 표정을 그대로 살리면서 자연스러움을 연출할 수 있다. 따라서 소극장에서의 공연은 자연스러운 예술을 표현하는 공간이며, 대중과 예술인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하여 극단이나 단체가 자유로이 공연할 수 있는 소극장을 지역적으로 확보하는 일은 지역적인 특색과 사회적 관심사를 증폭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시드니에 십만 명이 넘는 한인들의 문화예술을 위한 그 흔한 소극장 하나 없다. 한인의 유동인구가 많은 스트라스필드, 이스트우드, 채스우드, 어느 지역에도 한국인들을 위한 소극장이 없다. 인구가 몇 천도 안 되는 라트비안 그리고 러시아인들은 그들만의 소극장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들이 그만큼 모국의 문화예술의 존재 가치를 호주에서도 이어 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들에게도 처음이 있었듯, ‘소극장 운동’이란 용어도 처음이 있었다.
이 용어는 프랑스 파리 최초 독립극장이었던 테아트르 리브르(Theatre-Libre)에서 시작되었다. 당시에 만연해 있던 상투적인 대극장 연극에 반기를 든 앙드레 앙투완을 중심으로, 사실주의 형식으로 무대를 표현하고자 ‘자유극장’을 창설하고, 그래 3월, 200여 명의 관객만이 들어가는 작은 극장에서 아마추어 배우만으로 자연주의 희곡으로 첫 공연을 올렸다.
이후 앙투완은 고정 관객과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획기적인 예약제를 도입함으로써 연극계를 변화시켜 나갔다. 이것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 소극장 운동이 뻗어 나갔으며, 독일, 영국을 지나 미국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미국에서의 소극장 운동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 비영리적 연극 활동이 왕성하게 이어 나갔다.
50년대 미국의 소극장 운동의 노력은 브로드웨이가 획일화되고 상업화된 것에 반대하는 오프 브로드웨이(Off-Broadway)를 들 수 있다. 브로드웨이를 떠나 워싱턴 광장을 중심으로 가설무대를 마련하였는데 주로 식당이나 창고, 술집 등을 개조해 공연 했다.
그리하여 1956년에는 90개의 소극장이 생겨났다. 하지만 50년대 물가 폭등으로 위기를 맞아 생계와 수입을 위해 다시 대중적인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브로드웨이 극장으로 떠나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불만을 가진 연극인들은 ‘오프-오프 브로드웨이(Off-Off- Broadway) 극장가를 만들게 되는데, 방치된 창고와 공장, 교회 등을 급조하여 공연을 올렸으며 제한된 관객들을 대상으로 그 활동을 펼쳐나갔다.
강해연 / 이유 프로덕션 & 이유 극단(EU Production & EU Theatre) 연출 감독으로 그동안 ‘3S’, ‘아줌마 시대’, ‘구운몽’, ‘구운몽 2’ 등의 연극과 ‘리허설 10 분 전’, ‘추억을 찍다’ 등의 뮤지컬, ‘Sydney Korean Festival’, ‘K-Pop Love Concert’ 외 다수의 공연을 기획, 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