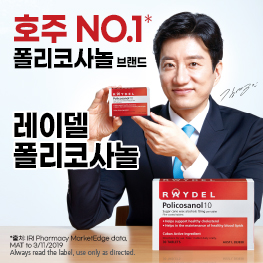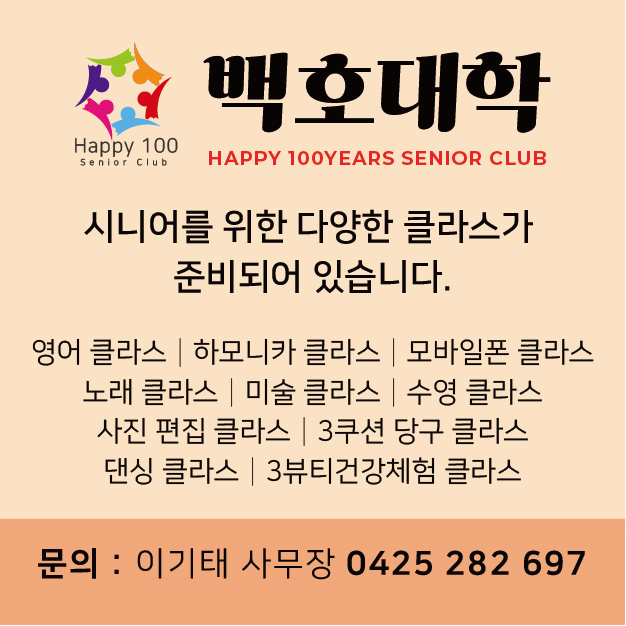“너 오빠 믿지?”
“아잉 오빠 왜 그래…? 내가 오빠를 안 믿으면 누굴 믿어? 오빠 좋아~”
“오빠 믿으면 오늘 집에 못 들어간다고 전화해!”
“엥?? 오빠아아앙!”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세상을 깨우치는데 가장 큰 이치가 이 문장에 들어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처절하게 깨닫는 건. 사람을 믿지 마라. 처음에는 아무도 모른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이라는 책은 아무리 표지가 좋아 보여도 마지막 에필로그를 읽을 때까지는 알 수 없다고.
처음 극단에 들어오는 이들에게 말한다. 아직은 밥이 안 되는 예술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낮에는 밥이 되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예술을 하자. 그 길만이 끝까지, 꾸준히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녁에도 밥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불편한 사실을 알고도, 우린 밥보다도 연극을 택한 사람들이다. 취미 아니면 인생이 심심해서, 아니면 정말 꿈이었던 연극을 하는 이들에게 나는 고한다. 여긴 취미 생활하는 곳이나 심심해서 하는 곳이 아닌 ,꿈을 꾸어도 전쟁 같은 꿈을 꿔야 하는 전장 같은 극단이라고. 하도 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어떤 이는 나에게 차라리 극단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극으로 올리면 더 흥미로울 거란다. 사실이다. 극단에서 발생하는 일은 작은 세상사다. 사람들이 모였다. 그것도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느 다른 이보다도 백배는 끓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들의 생각과 행동들을 연기로 소화하는 과정이 참으로 용광로보다 뜨겁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말한다. 배우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고. 다른 이들보다 뜨겁다 보니 넘치기도 하다. 어느 집단이나 조직이든 그럴 거라 생각된다. 사람 사는 곳이라면 비슷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연극을 하고 영화를 만들고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극단에서는 더욱 더 인성과 근성을 요구한다. 어떤 이는 이 길이 맞는지,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긴 한 건지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 의심할 만하다. 하지만 그 의심을 의심에서 그치지 말고 더 노력해야 하고 더 연습해야 한다. 그래서 작품을 계속하도록 만드는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손가락질해도, 비평해도, 비웃더라도, 절대 작품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연극 작품을 계속하는 한 예술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이 예술에 대한 ‘믿음’이다.
영화 ‘John Q’에서 덴젤 워싱턴(Dezel Washington)이 심장이식을 못해 다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급기야는 자신의 심장을 줄 각오를 한다.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말한다. “내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다. 이 집에서. 그러니 엄마 말 잘 들어. 엄마한테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한다고 말하고. 지금 너는 어린 나이지만, 나중에 여자가 생기면, 그들을 공주처럼 모셔라. 그런 존재들이다. 여자들은.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라. 아빠처럼은 살지 말고, 하지만 이거 기억해. 무엇보다도 좋은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는 좋은 사람. 그거만 명심하면 된다… 아빠 믿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이는 대답한다. “…믿어…” 고개를 끄덕이는 아빠는 아들에게 의미심장하게 말한다. “…나중에 보자”
돈이 없는 노동자에다 의료 보험조차 정책이 바뀌어서 받지 못해, 눈앞에서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봐야 하는 아빠로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병원에 총을 들고 들어가 아들이 심장을 이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11명의 인질까지 잡아서 협박을 한 건 분명한 범죄이지만, 영화에서 조명하고자 한 것은, 한 좋은 인간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러야 했는가 이다. 그리고 선한 사람은 악한 짓을 해도 끝까지 선한 사람이란 것을 영화 곳곳에서 처연하게 보여준다. 책의 에필로그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영화는 보여준다.
착한 사람이 총을 들고 난동을 부린다고 생각해 보라. 덴젤 워싱턴이 연기했던 착한 사마리아가 어쩔 수 없이 악인이 되었지만,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하려 하는 연기의 노력이 보인다. 연기는 기술력을 요하기도 하고 실력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기술과 실력이 아니다. 남의 인생에 자신의 인생을 넣어 또 다른 인생을 만들어 내는 심오한 작업을 어찌 기술과 실력으로만 되겠는가. 연습과 연습. 그리고 그 연습 끝에서 자기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에 대한 것이 ‘연기’다. 다 죽어가는 어린 아들을 위해, 자신의 심장을 주고자 자기 머리에다 총구를 갖다 대는 덴젤 워싱턴의 연기를 보면서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자기 분신 같은 자식이라지만 말이다. 죽으면 다 소용없는 데도 말이다. 그러면 세상에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는 없을 거야… 하는 순간 보았다. 총구를 머리에 갖다 대고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을 때, 안전핀 때문에 총알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1초 동안 살아 있음에 안심을 하는 존(주인공)의 표정을. 덴젤 워싱턴이 아닌 존의 표정을 말이다. 그리고 바로 낙담하는 표정을 기가 막히게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1초 사이 삶과 죽음의 갈등 의지를.
어떤 일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끝까지 가지 않고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 끝까지 가는 것도 그 끝이 어딜까 고민해야 한다. 바닥을 칠 때도 있고, 하늘을 찌를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실어주는 이들이 많아진다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오빠를 믿을지 말지 고민하듯이, 그래서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맞아도, 발등이 찍혀도, 그 ‘믿음’이 있는 한, 한 길뿐일 것이다. 영화처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츄에이션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믿는 그것을 향해.
사람을 믿지 마라. 다 알고 있는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오빠를 한 번 믿어 보련다. 그리고 하늘에 빈다. 제발 오빠를 믿어야하는 시츄에이션은 노땡큐라고.
강해연 / 이유 프로덕션 & 이유 극단(EU Production & EU Theatre) 연출 감독으로 그동안 ‘3S’, ‘아줌마 시대’, ‘구운몽’ 등의 연극과 ‘리허설 10 분 전’, ‘추억을 찍다’ 등의 뮤지컬, ‘Sydney Korean Festival’, ‘K-Pop Love Concert’ 외 다수의 공연을 기획, 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