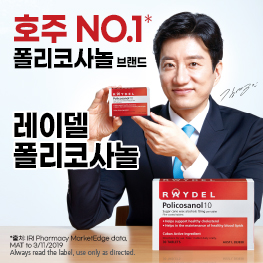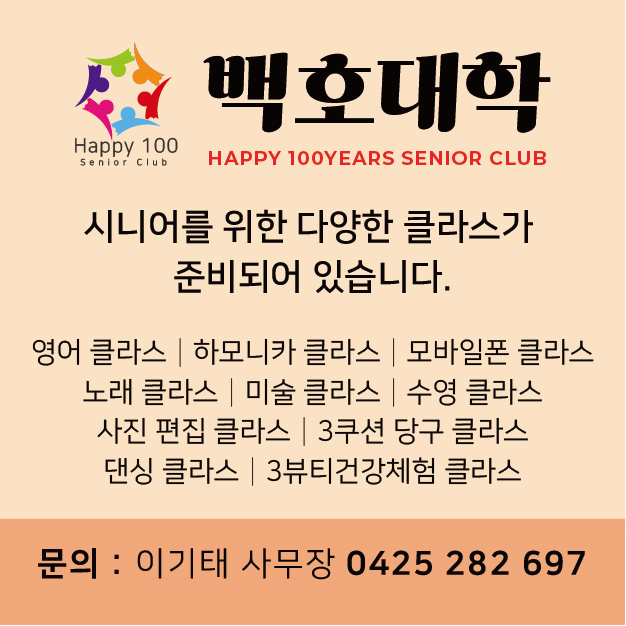고도는 오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고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연극은 시대의 산물이며 정신이다.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의 줄거리는 한마디로 ‘기다림’이다. 1막에서 두 남자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한 국도의 작은 나무 옆에서 ‘고도’라는 이름의 사람을 기다린다. 그들은 고도가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고도에게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 고도를 기다린다. 둘은 이야기를 하지만 마치 서로 벽에 외치는 것과 같은 피상적 대화를 나눈다. 그러던 중 그들 앞에 포조와 그의 짐꾼 럭키가 등장한다. 역시 두서없고 무의미한 대화가 이어진다. 밤이 되자 심부름을 하는 소년이 나타나 그들에게 “고도 씨는 내일 온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2막(다음 날)도 비슷한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는데, 등장인물들의 변화로 더 괴이한 느낌을 준다. 마지막엔 역시 소년이 등장하는데, 둘의 대화는 도무지 맞물리지 않는다. 결국, 블라디미르는 소년에게 화를 내며 쫓아버리고, 잠을 자다 깬 에스트라공이 고도가 왔었는지 묻는다. 그는 차라리 멀리 떠나자고 하지만 블라디미르는 내일 고도를 만나러 여기 와야 한다고 상기시켜준다. 둘은 나무를 쳐다보며 목이나 맬까 하지만 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일 끈을 챙겨와 고도가 안 오면 매자고 다짐한다. 두 사람은 입으로는 떠나자고 하면서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무엘 베케트의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Samuel Beckett, Waiting for Godot)는 연극을 좋아하지 않는 이라 할지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접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연극은 한없이 지루한 연극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의 ‘지위’라는 것을 알고 이 연극을 보면 너무나도 재미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믿어도 된다. 이 지위를 간과하게 된다면 소름 끼치게 지루한 연극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니.
떠돌이들로서 친구관계인 블라디미르는 자신이 에스트라공보다 높다고 믿고, 그 생각을 에스트라공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마찰이 끊이지 않는다. 포조와 럭키는 지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주인과 하인이다. 그런데 우습게도 말로서, 떠돌이들은 럭키에게 낮은 지위를 행하고 포조는 떠돌이들에게 가끔 낮은 지위를 행한다. 이것이 종종 기발한 효과를 발휘한다. 예를 들어 떠돌이들이 럭키에게 왜 가방들을 땅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들고 있느냐고 묻는 장면이 있다.
포조: 이 문제를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그에게 그럴 권리가 있는가? 물론 있고 말고. 그럼 그가 그러기를 원하느냐는 문제가 따라 나오지. 나름대로 그럴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럼 왜 그러기를 원치 않느냐? (잠깐 둘러본 후) 신사 양반들, 그 이유인즉 이거죠.
블라디미르: (에스트라공에게) 이 말을 잘 적어 두게.
포조: 내게 잘 보여서 버림받지 않으려는 수작이죠?
에스트라공: 뭐라공?
포조:…사실, 저 녀석 짐 하나는 돼지처럼 끈다오. 자기한테 어울리는 직업이 아니지.
블라디미르: 저 친구를 버릴 생각이세요?
포조: 녀석은 내가 자기가 지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 결정을 후회할 거라고 상상하죠. 그게 저 녀석의 가당찮은 구상이죠. 내가 노예를 아쉬워하기라도 한다는 듯이 말이지(세 사람이 동시에 럭키를 쳐다본다)
지위를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 치는 포조는 정말은 아주 높은 지위의 주인이 아니다. 그는, 땅은 소유했지만, 공간은 소유하지 못했다.
한국의 현 대통령의 지위는 아주 높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 높지 않은 지위의 주인이다. 국가는 소유했지만, 국민은 소유할 수 없기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재의 한국은, 럭키와 포조 같은 억압과 피억압 인의 횡포로 불안과 공포, 비합리로 휩싸인 현실 세계의 모습이다. 그리고 한국 국민은 에스트라공과 블라디미르와 같이 고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한국 국민이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은, 그들의 생의 연장으로서의 방편이다. 기다림을 포기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의 지배적 분위기는 우울함과 고뇌이다. 에스트라공과 블라디미르는 고뇌하고 있다. 단지 우스꽝스럽게 말이다.
절망적 세상의 탈출구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결국 나타난 것은, 고도의 전령인 소년이다. 소년은 때 묻지 않음을 의미한다. 절망적 세계의 유일한 희망은 이런 아이들의 손에 달린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과연 고도는 무엇일까? 고도는 모든 ‘상징’일 것이다. 고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그래서 인간은 고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다. 기다릴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강해연 / 이유 프로덕션 & 이유 극단(EU Production & EU Theatre) 연출 감독으로 그동안 ‘3S’, ‘아줌마 시대’, ‘구운몽’ 등의 연극과 ‘리허설 10 분 전’, ‘추억을 찍다’ 등의 뮤지컬, ‘Sydney Korean Festival’, ‘K-Pop Love Concert’ 외 다수의 공연을 기획, 연출했다.